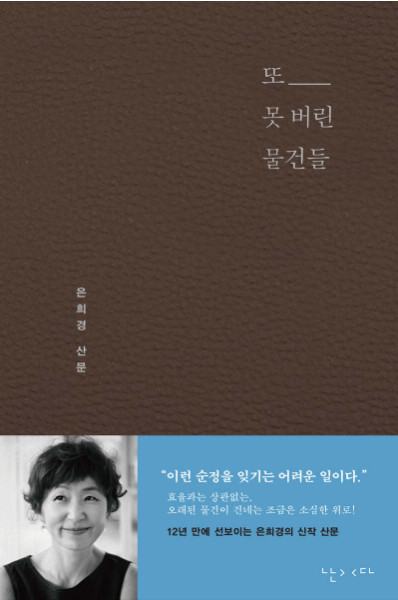[도서] 또 못 버린 물건들ㅣ은희경
[도서] 또 못 버린 물건들ㅣ은희경
또 못 버린 물건들ㅣ은희경
(검색이 귀찮아서) 기억을 뒤져보건대 『또 못 버린 물건들』은 은희경의 두 번째 산문집이고, 첫 번째 산문집은 『생각의 일요일들』일 거다. 그리고 『생각의 일요일들』 다음에 출간한 소설집은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이고. 그리고 이 소설집이 내가 산 은희경의 마지막 책이다. 아마 그럴 거다;
왜 갑자기 은희경의 글과 소원해졌을까. 오랜만에 은희경의 신간 산문집 『또 못 버린 물건들』을 읽는 동안 뒤늦게 이유를 깨달았는데 『태연한 인생』에서 의심을 품었고 『다른 모든 눈송이와...』에서 확신한 그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은희경과 변한 나의 간극이었다.
각설하고.
은희경의 첫 번째 산문집 『생각의 일요일들』은 예쁜 팩키지로 배송받아 랩핑 채 책장에 꽂혔고 덕분에 작가의 두 번째 산문집 『또 못 버린 물건들』이 내가 읽은 첫 산문집이 되었다.
은희경의 신간을 읽는데 문득 아재의 아줌마 버전은 뭘까 궁금해짐. 궁금한 건 못 참지. 책을 읽다 말고 근처에서 유튜버가 요약해주는 영화 리뷰를 보고 있던 S에게 '아재의 여자 버전은 뭐야?' 물으니 생각하는 시늉도 안 하고 모른다는 대답이 재깍 돌아왔다. 어쩌겠나. 혼자 고민해야지. 일단, '아재'는 사투리 아닌가? 그럼 (아줌마→아지매(사투리)→)아짐인가? 근데 '아줌마' 호칭에 칼부림 사건이 있지 않았나? '아저씨' 불러서 칼부림 사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호칭이 여자에겐 소위 나이 공격인가? 남자는 나이가 공격 수단이 아닌 거고? 글고보니 백화점에서 '아버님'이라고 불러서 충격받았다던 서른 초반 누구의 탄식에선 분노가 아니라 울분이 느껴졌지...아, 망할 의식흐름...그만하자.
은희경의 신간을 읽는 건 q&a를 반복하는 경험이었는데 은희경의 소설 속 인물들이 위악을 두른 배경을 들을 수 있었고, 홈에 발췌도 했지만 은희경의 소설을 통틀어 가장 좋았던 묘사(『태연한 인생』)의 배경을 알게 된 것도 반가웠다(p.107)
하지만 산문집 자체는 썩 만족스럽지 않다. 책의 제목과 목차를 볼 때만 해도 『윤광준의 생활명품』 류인가 했는데 이는 저자의 직업이 소설가라는 것을 간과한 편견이었고(근데 소설가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박완서 류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정리하자면 산문이 작가의 신변잡기 문학이라면 은희경의 신간은 신변잡기는 있지만 문학은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작가의 정체성 혹은 성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글 전반에 들뜬 분위기가 만연한데 아쉽게도 내 기준 작가의 하이(high)한 감성에 공감보다 거리감을 더 많이 느꼈고 이는 비유하자면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타인의 전화 통화를 듣는 기분이었다.
사실 은희경 정도의 위치라면 편집자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않겠나 싶은... 즉슨, 책 전반에 널려있는 괄호 부연은 빼는 것이 나았다고 본다. 작가의 개성, 특징 이런 걸로 이해하기엔 솔직히 이런 편집 자체가 너저분하다. 책과 개인 sns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여 표지부터 내지까지 고급지게 잘 만들고선 정작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못 버린 물건'의 사진을 썸네일마냥 조그맣게 싣고 지면을 낭비한 편집은 아쉽기도 하고 이해불가다. 내처 이 책은 작가를 위한 기념굿즈인가 갸웃하기도.
굳이 작가가 젊어야 한다고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는 아마 대다수 독자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애초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박완서, 이윤기라는 산문 문학의 좋은 전범을 갖고 있기도 하고(이분들 사이에 사심으로 황현산도 넣어본다). 산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공식은 없지만 작가의 산문을 읽을 때 (내 기준)으레 뻔하고 식상하고 도식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걸 기대하는데 은희경의 신간은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족을 붙이자면 나는 쓰지 않지만 종종 전해듣던 카카오스토리의 프사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을 전시하는 느낌이 이런 걸까 싶던...
그럴리야 없겠지만 퇴고가 덜 되었나 싶은 난삽한 문장이 간혹 보인다. 발췌는 뭔 소리야 했던 대목.
먹는 것이 요리의 전 단계라는 생각은 요즘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반드시 구현해낼 의무는 당연히 없다. 미각을 개선시킴으로써 잠재력만 키워도 요리 관계자(요리사는 아닌)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p.23 『또 못 버린 물건들』
작가는 '트렌디'하길 원한 것 같은데 빌려입은 옷처럼 어색해서 오히려 '올드'한 인상을 풍긴다. 원인은 내용이 아니라 텍스트 표현 방식 때문인데 어쨌든 내가 막연히 기대했던 소설가 은희경의 산문은 아니었다. 은희경의 산문을 덮으면서 느낀 감상은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의 그림자였다.
변화를 겪은 시대 정서를 고려하여 『새의 선물』 개정판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지칭하는 혐오/비하 단어를 빼버렸다는 작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소설에서 '앉은뱅이 책상'을 뺀다고 해서 1960년대 그 시절에 '앉은뱅이 의자'가 존재한 적 없었던 단어가 되는가, 라는 소위 작가주의식 리얼리티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신간 산문집은 그 의문의 심화단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은 우리의 정면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지만, 만약 정면에 놓여 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뚫고 나가야 할 때라면 그렇게 해야겠지. 언제나 인간의 편으로 같은 자리를 지켜주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예술, 문학의 위로와 함께. 장난감과 작별한 지 백만 년이 된 내가 침대 머리맡에 요시토모의 인형을 놓아두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맞다. 한창 인형을 좋아할 나이라서이다.
p.167 『또 못 버린 물건들』